음식궁합
현대의학은 점차 식물 유래 성분의 분자구조와 그 효능을 밝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루테인, 폴리페놀, 크랜베리 등은 항산화, 항염증, 항노화, 이뇨 작용에 뛰어난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방광염 예방 및 개선과 같은 비뇨기계 건강에 있어 이들 성분의 역할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크랜베리에 풍부한 프로안토시아니딘과 같은 특정 폴리페놀 성분은 병원성 세균의 요로 점막 부착을 억제하는 살균 효과를 나타내며, 루테인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망막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적 성과는 분자생물학적 분석과 임상 데이터에 의해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이 현상의 근원은 식물과 동물 사이의 오랜 진화적 상호작용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덩굴식물이나 관목류는 스스로 이동할 수 없기에 열매라는 매개체를 통해 번식을 꾀한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하다. 열매를 더 눈에 띄게 만들고, 더 맛있게 만들며, 더 많은 유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크랜베리의 붉은 색소는 시각적으로 새와 포유류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며, 여기에 풍부하게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소비자, 즉 동물에게 생리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루테인처럼 눈 건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성분은 열매를 섭취한 동물이 더 밝은 시야를 유지하게 하여 자연에서 먹이와 위협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곧 생존율을 높이고 열매를 다시 찾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식물의 씨앗은 더 멀리, 더 널리 퍼져 나간다.
즉, 식물이 자신을 먹는 존재에게 실질적인 생리적 도움을 주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전략이다. 눈에 좋은 루테인, 요로 건강을 돕는 크랜베리의 폴리페놀,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이뇨 효과는 모두 식물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적 목적 아래 구성된 정교한 생화학적 설계다. 인간이 현대의학으로 이를 활용하게 된 것은 단지 그 자연의 전략을 해독해 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물의 순환처럼 유기적이고 반복적인 이 구조는, 우리가 자연에서 받은 치유의 본질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금 일깨운다.
한의학은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현대의학이 분자구조와 기능적 효능을 분석하여 밝혀낸 것을, 한의학은 음양오행이라는 설명 체계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왔다. 예를 들어, 크랜베리의 이뇨작용이나 방광 건강에 대한 작용은 한의학의 수(水)의 흐름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며, 이는 단순한 생리적 효과 이상의 흐름과 균형의 개념으로 설명되었다.
한약 재료 가운데 오미자, 구기자, 결명자, 산수유 등은 각각의 색, 맛, 계절적 특성, 장부와의 연결성 등을 기반으로 그 작용 방향성이 정리되어 있다. 오미자는 폐와 신장을 보하고 기운을 수렴하며, 구기자는 간과 신을 보하여 눈과 혈을 이롭게 하며, 결명자는 간의 열을 내리고 눈을 맑게 하며, 산수유는 간신을 보하며 정기를 수렴하여 자양강장의 작용을 나타낸다. 이처럼 한의학은 단지 효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이 자연 속에서 어느 방향을 바라보며 어떤 생명적 흐름에 기여하고자 하는지를 함께 본다. 이는 단순한 경험의 축적이 아닌, 자연의 이치를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철학적 접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의학이 ‘관찰되기 전에도 이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진다는 점이다. 즉, 어떤 현상이 실험이나 분석을 통해 눈에 보이기 전에도,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를 이치와 상응성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식물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열매를 맺으며, 어떤 동물과 교류하는지를 보는 사람은, 그 식물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결과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예언이 아니라 관통하는 통찰이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자연을 연구하는 일은 단지 분해하고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그 속에서 숨은 질서를 이해하려는 겸허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앎의 시작이다. 식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듣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과 삶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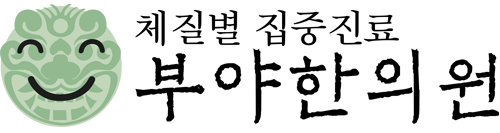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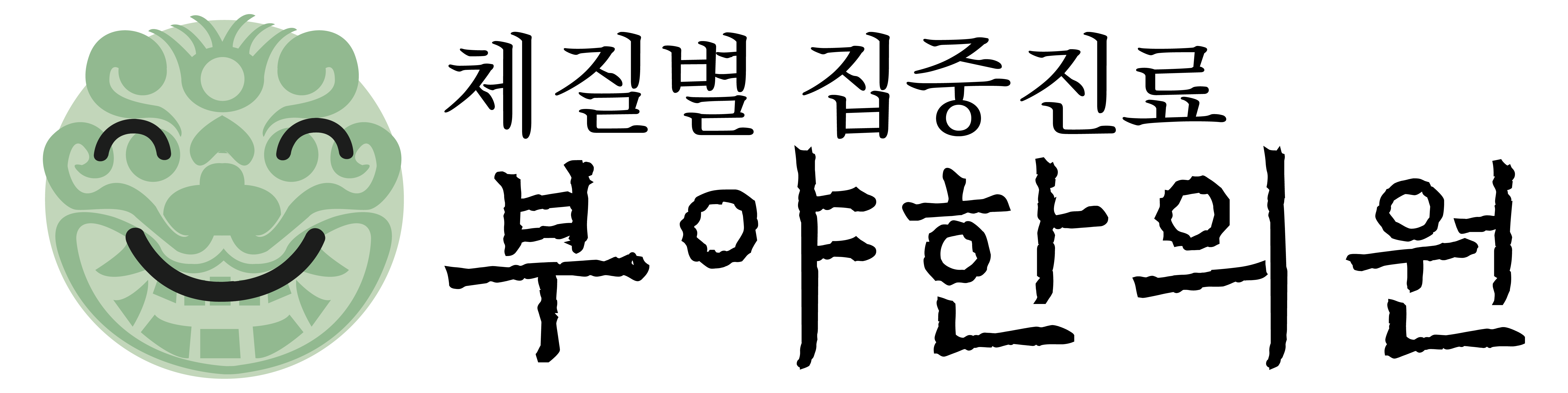
















 메밀의 약리적 효능
메밀의 약리적 효능 제철음식 장어
제철음식 장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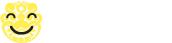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가마실길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가마실길1